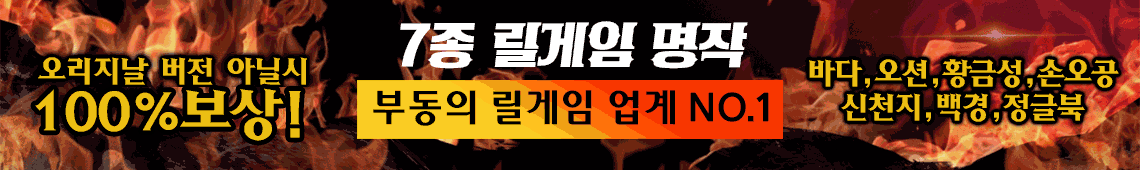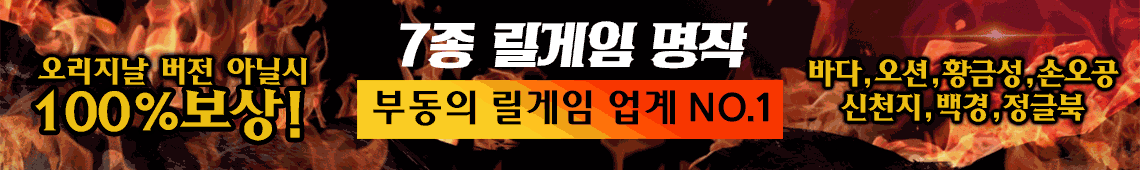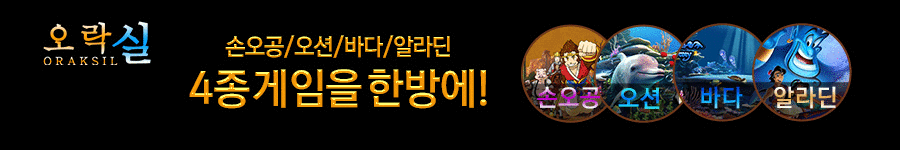보고 싶다 - 2부
작성자 정보
- 밍키넷 작성
- 작성일
본문

제2부 조심스러운 발걸음….
그녀의 곁에는 수려한 용모의 금발 머리 남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웃는 얼굴로 그 남자를 고개가 꺾어지도록 올려다보면서(무척 키가 큰 장신의 남자), 유창한 독일말로 내 소개를 했다.
내미는 그 남자의 손이 무척이나 컸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은 외국인이라는 어설픈 경계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으며, 그 남자는 자기가 그녀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녀와 나누던 독일 말이 아닌, 나에게는 영어로 인사하였다.
내가 머쓱해하자, 그는 애써 생각해 냈다는 표정으로, “안녕하세요.”라는 어눌한 발음의 한국말도 잊지 않고 덧붙였다. 그와 동시에 나도 조금은 누그러지는 분위기로 멋쩍게 웃음을 나누었다.
“뉴욕에는 어떻게?”
“응. 학술 세미나가 있어서 말이야. 잠시 있다가 캐나다로 가야 하고, 거기서 샌프란시스코….”
“캐나다요?”
“응. 왜?”
“저 지금은 거기 살아요. 그것도 토론토에…….”
“그래? 그거 잘됐네…. 그런데, 여기는 어쩐 일로……”
“한국에서 온 퍼포먼스 극단의 난타라는 공연을 보려고요. 여기 제목은 한국에서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지만….”
“남편이 능력 좋은가 봐…. 먼 데까지 와서 공연도 보고…”
“뭘요…. 외국에서 살다 보면 공간과 거리에 대한 가시영역이 넓어지는 편이에요. 차로 10시간 이내라면 가깝다는 생각을 우선 해요.”
“살고 있다는 토론토랑 뉴욕은 어느 정도 거리가 되지?”
“차로 한 14시간 정도? 세게 밟으면 1시간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차를 타고 온 적은 없어요. 언제나 올 일이 있으면 이렇게 남편이 비행기랑 렌터카를 모두 예약해 놔서 별 불편 없이, 두세 시간 안에 뉴욕 시내에 들어가죠. 그런데, 일행이 있으세요?”
“아니, 그냥 가려다가 얼마나 정도 환전을 하려고 다시 공항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지…. 바쁠 텐데, 먼저 들어가. 연락처나…. 아니, 여긴 참 뉴욕이지……”
“어느 호텔에 계실 예정이세요? 어디 예약한 곳이라도?”
“글쎄, 같은 곳이 아니면 초행길에 만날 수나 있겠어?”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녀는 내가 묵는 곳으로부터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호텔에 투숙할 예정이었다. 나와의 대화를 빠짐없이 독일말로 전달하자, 남편이라는 사람도 표정이 밝아지면서 나에게 오늘 저녁, 공연이 끝나고 술이나 한잔하자고 까지 선약을 넣었다.
공항 입구에서 나와 그녀, 그리고, 처음 본 파란 눈의 남편은 구석의 의자에 앉은 채 그렇게 20여 분이 넘도록 얘기를 나눴다.
남편은 산업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했고, 사는 것도 그런대로 여유가 있어 보였다. 독일에서 만났으며 박사학위를 받고 Job Market에 나가자마자 손을 뻗어 온 곳이 캐나다의 대학이란다.
미국보단 보수나 대우 면에서 척박하지만 조용하고, 미국의 뉴욕이나 LA처럼 한인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선택의 이유 중 하나였다고 했다.
그렇지만 캐나다에 올 당시와 다르게, 이제는 조기 유학의 붐에 편승해서 물밀듯이 한인들이 들어 오고 있어서 조만간 자신이 사는 곳도 뉴욕이나 LA와 같은 짝이 날 거라면서 한숨을 폭 내쉬기까지 했다.
그녀와 나는 서로가 호텔의 호수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의상이었겠지만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만나자는 그녀의 말끝에서 나는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이 뚝뚝 떨어지는 외로움이 느껴지고 있었고, 푸른 하늘과 대비되는 그녀의 파스텔 색상의 니트와 스커트가 그 색감과는 다르게 을씨년스럽게 보이기만 했다.
남편의 학교 수업 일정 때문에 이틀 먼저 뉴욕에 왔다는 그녀…. 나는 두 사람을 따라 주차장으로 가면서도 내내 손에 쥐어진 그 메모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오래전에 보았을 때보다 조금은 통통해진 듯한 얼굴과 분위기….
“식구들은요?”
“잘 있지……. 애는 잘 크고?”
“네.”
나와의 대화를 전달하면서 슈나이더라는 이름의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이 내게 질문했는데, 어째서 한국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끼리 포옹이나 입맞춤이 없나 하는 것이었다.
그건 그랬다. 유달리 신체접촉에 강한 외국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 무뚝뚝한 민족일 수 없을 테니까.
공식적인 신체접촉을 자제하는 민족성이 자칫 관계 모색에 서투른 부류로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가져보았다.
두 사람은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독일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섞어가며 구사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부러움을 자아내게 했다.
“제 영어 이름은 에이미예요. 좀 이상하죠? 한국말처럼 들리기도 해서 남편에게 이 말을 한국 사람에게 잘못하면 엄마라는 뜻이 된다고 했어요. 깔깔깔….”
운전하는 남편도 대강의 의미를 알아차렸는지 맞장구를 치며 웃어 주었다.
공연은 저녁 8시라고 했고, 10시 반쯤에 내가 묵고 있는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하고서 두 사람은 나를 차에서 내려놓은 뒤, 손을 흔들며 사라졌다.
이제는 한국 사람이라기보다 외국 사람에 더 가까운 모습과 언어 등에서 약간의 이질감마저도 느꼈지만, 그것이 머나먼 타국에서의 생활에 있어서 향수를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런대로 받아들일 만했다.
언제나 아시아 지역만을 출장 다니다가 이렇게 미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에 발을 딛고 보니 무척이나 신기한 것이 많았다.
우선 나를 가장 쪽 팔리게 했던 것은 공중화장실의 변기였는데,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기에 앉는 순간, 바닥에서 달랑 들어 올려져 댕그랑거리는 두 발 때문이었다.
비싸기는 오지게 비싸지만, 코딱지만 한 구조로 되어 있던 일본의 호텔과 비교해 보면 미국의 분위기는 운동장에 가까웠다.
마천루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하라는 의미에서 방향을 잘 틀어잡은 호텔 방의 전망 구조였지만, 911사태로 사라진 쌍둥이 빌딩이 없는 뉴욕의 도시 풍경은 어쩐지 허전한 감을 버릴 수가 없었다.
나는 밀려오는 졸음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일정은 너무나 타이트했고, 나는 짐을 풀기도 전에 캐나다로 향할 비행기의 탑승 컨펌을 먼저 해야 했고, 참석해야 할 세미나 장소에 대해서도 지도를 보며 숙지해야 했다.
서울처럼 지하철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얘기로 겁도 나고 해서 되도록 택시를 이용하고자 계획을 잡았다.
시차 적응을 위해서 나는 무거운 눈꺼풀을 참아가며 간단한 옷으로 갈아입고 호텔 주변을 다녀보기로 했다.
편의점에 들어서는 순간, 눈에 띄는 누드 잡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나는 되는대로 몇 권과 물, 음료수, 그리고, 이름하여 양담배도 한 갑 사가지고는 가게를 나왔다.
무거운 짐을 든 채로 다니기에는 너무 많은 시선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에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음료수를 마시면서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서울 같으면 어림도 없을 기가 막힌 잡지…. 인터넷의 붐으로 인해 점차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누드 잡지사들….
학생 시절,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흠모와 애정 어린 대상이었던 그 누드 잡지들도 이제는 여인들의 나체로 성에 차지 않는 독자들을 향해, 본격적인 포르노 정사 장면으로 잡지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끝내주는 미모의 여성을 무지막지한 좆으로 마구 쑤셔대는 장면이 그 아름다운 빛깔로 적나라하게 까발려져 있는 잡지들…. 그것은 나에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던져주는 또 다른 충격이었다.
어느 잡지를 보아도, 예전에 숨어서 보던 조잡한 인쇄 상태와 천한 색감의 저질 음란서적과 달리, 누드 잡지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일급 모델을 유린하는 거포의 함성은 나 같은 구세대의 눈에는 이게 웬 떡이냐는 심정으로 밖에는 해석되고 있질 않았다.
그 수려한 색채와 보지의 속살 주름과 씹물의 질척임 하나하나까지 샅샅이 확인되는 그 해상도의 사실감, 보지를 장쾌하게 꿰뚫는 그 말 좆들의 툭툭 불거진 핏줄이 금방이라도 잡지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생생함, 나는 정신없이 잡지에 빠져 있었다.
나는 외국에 나와 있다는 생각도 잠시 잊은 채, 잡지를 손에 든 채로 이미 발기되어 버린 내 좆을 옷 위로 쓰다듬기 시작했다.
“따르릉, 따르릉!”
그때, 전화가 울렸다.
“Hello?”
“저예요…. 여기 로비예요. 내려오실 수 있어요?”
나지막한 톤의 그녀 목소리였다.